게임장애Gaming Disoder) 국제질병분류 ICD-11
- - 짧은주소 : http://simsangro.com/bbs/?t=D
본문
게임장애 Gaming Disoder
게임장애...게임으로 인한 문제는 어느 부모님, 상담가에게 있어 문제적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식 질병(ADHD, 분노조절장애등)의 목록으로 되어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에 게임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는지 미국국제질병분류인 ICD-11판에
2020년경 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질병으로서 정식등재를 앞두고 있다.
게임장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개인, 가족, 사회교육 또는 직업상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 라고 설명했으며,
진단을 위해서는 게임장애의 부정적인 패턴이 12개월 이상 지속하여야한다고 기준을 확실하게 명시하였고
기본적으로몇시간 또는 며칠은 질병 판다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진단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증상이 심각할 떄는 지속기간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구체적 치료법 제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기존의 심리적 문제에 사용되어져왔던 다양한 치료법이 해당되고
미국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캠프에서 게임장애를 치료한다고 한다.
그러나 제임장애 등재에 대한 반대측의 의견으로
미국의 앤서니 빈 교수는
게임을 질병화 진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이르며, 어떤 행동도 쉽게 질병화 될 수 있는"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적상황에서 한국 통계청에서는 2025년까지는 게임장애에 대한 것을 보류한다고 하며 다양한 각계의 관련 여론도 있는 상태이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
지난 칼럼의 ADHD처럼 질병화 하여 다른 마케팅적 요인과 함께 부작용적 양상이 드러나게 될것인가?
아니면 조기에 게임중독 양상의 치료적 접근으로 긍정적 결과를 나을 것인가?
늘 그렇듯 사람들은 공식적인 것에 등재되고 그렇지 않고의 그 이후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태도가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나,
가장 큰 테두리안의 목적은 게임으로 인한 개인의 삶을 저촉하는 부정적 양상을 막는 것이라는 입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진단이 목적이 아니라 한개인과 인간으로서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담자, 또는 환자의 경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사회적 현장이 생긴것이라는 생각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심리적 질병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그 개인 뿐 아니라 주변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러한 것을 얼마나 객관화하여 판단해낼 수 있을지..
그저 결론적으로 진단요건에 맞는 것으로만 보게되지는 않을 지에 대한 생각도 들게한다.
항상 생각하지만 인간의 마음과 심리를 다루는 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 환자를 바라보는 객관적 확신만큼이나 자신에 대한 통찰과 확신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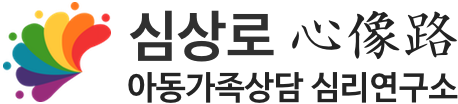


댓글목록 0